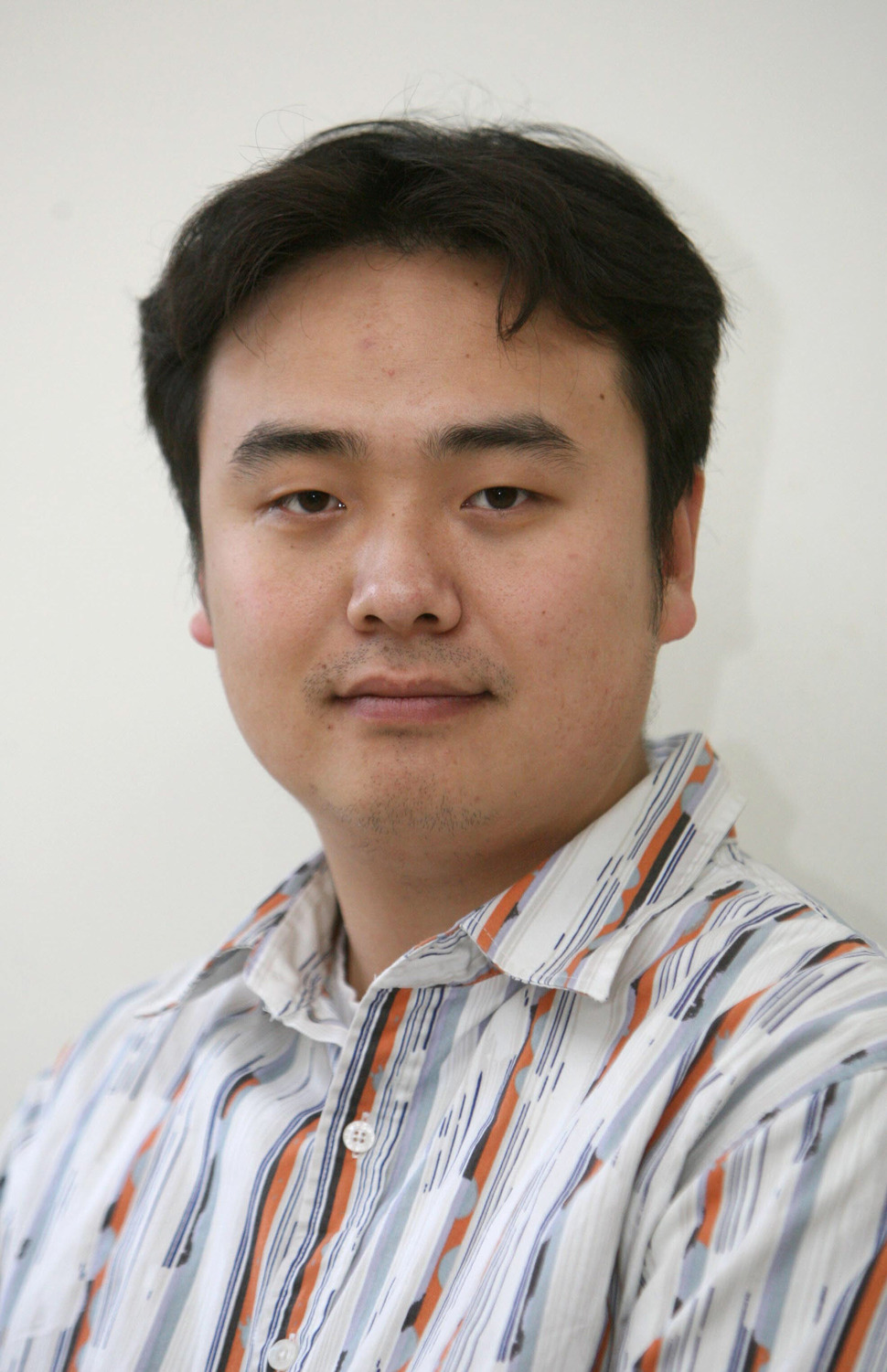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 블라하 루이자 광장 국립극장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동유럽사
제국의 일원에서 민족의 자각으로, 민족 운동에서 국가의 탄생까지
존 코넬리 지음, 허승철 옮김 l 책과함께 l 세트가 6만5000원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합스부르크 황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의 피살을 계기로 터졌는데, 이 엄청난 사건은 당시로선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한 민족”과 연관되었다. 암살자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보스니아에 사는 세르비아계 청년으로, 자신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유고슬라브(남슬라브)의 애국자”라 지칭했다. 오랫동안 오스만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은 1875년 대규모 농민 봉기를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 점령당한 참이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점령을 통해, 발칸 지역에서 세르비아인들이 주도하여 ‘남슬라브’ 민족국가를, 더 나아가 ‘대(大)세르비아’를 만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유고슬라비아’란 이름의 국가는 1차 대전이 끝난 뒤 탄생했으나 1992년 이후 다시 여러 나라로 갈라졌고, 그 과정에 인종·종교를 이유로 서로 다른 집단을 말살하는, 끔찍한 ‘인종 청소’의 비극을 겪었다.
역사학자 존 코넬리(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유럽사 교수)는 두터운 분량의 ‘동유럽사’에서 “발트해에서 아드리아해와 흑해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극적이고 역동적인 역사를 그려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튀르키예 등과 서쪽으론 프로이센·오스트리아·독일 등과 맞닿은 이 중동부 유럽 지역은 “지구상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좋든 나쁘든 20세기의 가장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라 할 만하다. 1800년 무렵의 지도와 2000년 무렵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단순한 지도에서 복잡한 지도로, 하나의 작은 국가와 세개의 큰 다민족 국가가 20개가 넘는 민족 국가로 바뀐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은이는 이토록 복잡한 이 지역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것은 “민족주의”라고 지적한다. 전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민족을 국가에 맞추기 위해 이렇게 자주,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국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1818년 무렵의 중동부 유럽 지도. 책과함께 제공
1999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중동부 유럽의 지도. 책과함께
프로이센 출신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는 “한 민족의 영혼은 그 민족의 언어”라 압축할 수 있는 ‘문화 민족주의’ 사상으로 근대 독일 철학에 한 돌파구를 제공했고, 독일인들은 자신들 세계의 전통과 가치를 발견하면서 “프랑스인, 영국인 또는 다른 큰 민족과 따로 서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문화적으로 독일의 영향권 아래 있던 슬라브계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독일인들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중동부 유럽의 인종언어 집단의 지도를 보면, 일정한 지역들을 연결하는 여러 ‘방언연속체’들의 존재가 눈에 든다. 러시아제국, 오스만제국, 프로이센 왕국, 합스부르크 왕가 등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이 ‘작은 민족’들은 제국과 투쟁하며 저마다의 민족을 상상해내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 치열한 투쟁의 경로는 ‘인종’이란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지은이는 지적한다.
유럽 전역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던 ‘1848년 혁명’은 그동안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민족들 사이의 분열”을 보여줬다. 모든 새로운 민족들이 독립을 얻으면 제국과 왕국은 더이상 존속할 수 없기에, 합스부르크제국은 여전히 군주정의 끄트머리를 붙들고 있었다. 예컨대 헝가리의 마자르 지배 세력은 ‘마자르’ 중심의 사회 통합을 추진했으나,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루마니아인 등 헝가리 내 여러 소수 민족집단들은 자신들의 ‘자치’를 위해 되레 합스부르크제국을 지지했다. 토착 체코인과 지배층 독일인이 뒤섞인 보헤미아에선 농민과 소도시 출신을 중심으로 체코인들의 실질적인 자치가 추진됐다. 중동부 유럽의 남쪽과 북쪽 끝인 세르비아와 폴란드에서는 군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제국에 맞선 민족주의를 추구했다.
1878년 유럽 열강들은 베를린에 모여 불가리아·몬테네그로·루마니아·세르비아 등 네 나라를 창설하고 국경, 헌법, 주권, 심지어 시민 자격까지 결정하는 데 이른다. 이 ‘베를린회의’는 ‘소수민족 보호’라는 20세기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진짜 문제는 여기에 “답보다는 의문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절반만 완성된 민족 국가”였던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대세르비아’로 나가고 싶어 했고, 불가리아 역시 국가 창설 과정에서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려 했다. “민족적 자아가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타자’가 필요했”고, 민족 문제는 ‘인종’의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해 새로운 종류의 ‘인종민족주의’로 나아갔다.
중동부 유럽의 인종언어 집단의 모습. 책과함께 제공
1918년 10월28일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기념식 모습. 책과함께 제공
1956년 혁명 당시 부다페스트 시내에 파괴된 스탈린 동상의 모습. 책과함께 제공
1918년 합스부르크제국이 멸망한 뒤엔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가 탄생했다. 나치 독일 점령과 소비에트 체제를 거친 뒤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됐고, 유고슬라비아는 유혈 사태를 거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로 분열됐다. 이에 대해 지은이는 초기 민족주의자들의 생각과 달리 “같은 언어, 심지어 같은 방언까지도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굴곡진 동유럽 인종민족주의에서 지은이가 짚어내는 핵심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인종 학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곧 ‘절멸’의 위협이다.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저지대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민족주의의 힘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 곧 특정 인종이 스스로를 상상하고 산출하게끔 만들도록 몰아붙이는 “인식적 위협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동유럽 지역에서 이러한 절멸의 두려움이 발달한 것일까? 일부에선 중동부 유럽이 ‘변방’이라서, 아시아에 더 가까워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그와 반대로 이곳이 “중간 공간”으로서 “경계가 없는 곳”이라는 특성을 부각한다. 사람과 사상 등의 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어서 다른 지역과 그만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원형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